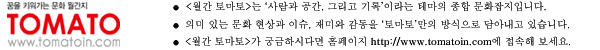

봉덕사는 주지 정범스님과 동자님 두 분, 총 세 사람이 지내는 조용한 절이다. 1970년, 일곱 살 때 봉덕사에 와 지금껏 지내는 정범스님은 “봉우리 일곱 개가 봉덕사를 감싸고 있습니다. 연꽃 속에 절이 들어앉은 형상이죠.”라고 봉덕사를 소개했다. 1739년(영조 15년), 이곳에 석문암이 생긴 이래 석문사를 거쳐 봉덕사에 이르기까지 약 300년의 세월을 간직한 곳, 이곳에 석조보살입상을 모셔온 건 1933년이다.
“당시 주지스님이었던 운암스님과 동네 유지 두 사람, 총 세 사람이 한날한시에 같은 꿈을 꿨다는 겁니다.”
내용인즉, 꿈에 부처님이 나와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꿈을 꾼 후 알아보니, 과거 언젠가 진잠초등학교 뒷산에 한사라는 절이 있었단다. 1933년 당시에는 절은 없어지고 절터만 남아있었다. 세 사람은 급히 그 절터로 갔다. 그곳에 석조보살입상이 엎어져 있더란다.
“엎어져 있던 걸 일으키니까 부처님 코가 납작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들 낳아달라고 오랜 시간 문질렀던 거죠. 그래서 코가 나오게 하려고 코 양쪽을 더 파서 지금과 같은 얼굴이 되었답니다. 원래는 더 둥그스름한 얼굴이었다는 거죠.”
기록에 따르면, 이 석조보살입상은 고려시대 이후 충청지방에서 유행한 토속적인 보살상이라고 한다. 아무튼 그곳에 있던 석조보살입상을 봉덕사로 옮긴 건데, 그것만도 대대적인 작업이었단다. 얼핏 보아도 3m 넘는 높이의 돌이니, 그 무게만도 상당했을 것이다. 당시에는 밀대 여섯 개 합친 크기로 판을 만들어, 통나무를 놓아가며 산비탈을 올랐다. 동네 아이들까지 총 동원해 밀고 당겨 올렸단다.

“하루는 꿈속에서 부처님이 나와 저를 부르더니 내 신발 좀 찾아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꿈속에서 밤새 돌아다녔는데도 신발을 못 찾았죠. 그래서 부처님께 죄송하다고 했더니, 빙그레 웃으며 다음에 찾아다 달라고 하시더군요.”
다음날 바로, 정범스님은 한사 절터에 갔다. 절터 한 구석에 석조보살입상 받침대가 보이더란다. 반은 땅속에 묻혀있고, 반만 드러나 있었다. 그날로 경운기에 받침대를 싣고 봉덕사로 왔다. 하지만, 문제가 또 있었다. 받침대 마모가 심해 몸체와 맞지 않았던 것이다.
“석공을 불렀더니, 그대로 올리면 또 넘어갈 거라고 그 사이에 쇠를 세 개는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부터 며칠 내내 항문이 아파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겠더군요. 고민 고민 끝에 석공을 불러 세 개는 그렇고, 가운데 하나만 박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나니까 신기하게도 항문이 안 아프더군요.”
우리는 어쩌면, 석조보살입상을 볼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혹은 지금과 같은 온전한 형태는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종교를 떠나, 여러 사람의 노력이 더해졌다. 그 덕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온전한 형태로 보존할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 정범스님의 말씀이 가슴을 깊이 울렸다.
“어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나는 그저 어른들이 이뤄놓은 걸 까먹고 살아갈 뿐인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