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材小用(대재소용)
큰 인물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작은 일에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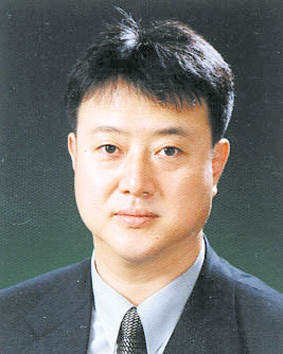 |
||
| ▲ 이재복 박사/배재대학교 홍보과장 | ||
재(材)는 나무 목(木)에 바탕 재(才)를 짝지은 글자로서, 집을 지을 때 바탕이 되는 나무 즉, ‘재목’을 뜻한다. 나아가 ‘재주’의 뜻으로도 쓰인다.
용(用)은 점 복(卜)과 가운데 중(中)을 어울린 글자로서, 옛날에는 점을 쳐서 맞으면 반드시 시행했으므로 ‘쓰다’는 뜻이 되었다.
남송(南宋)에 신기질(辛棄疾)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당시 그가 태어난 산동성은 여진족이 건국한 금나라에 정복당했다. 신기질은 금나라 타도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항금 의용군에 가담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남송 정부의 관리로 임명되었다.
그는 항상 금나라 타도를 외치며 영토회복을 위한 시문을 짓기도 했다. 이에 화평파에게 미움을 사 두 차례에 걸쳐 삭탈관직 당하고 고향에서 18년 동안 은거하였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남송의 정권을 장악한 한탁주는 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관직을 주었다.
그 무렵 남송 황제 영종이 금나라 토벌을 상의하겠다며 신기질을 항주로 불러들였다. 그는 이 일을 평소 국가의 대사를 논하던 친구 육유에게 제일 먼저 말했다.
이에 육유는 “북벌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조정에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 꼭 다녀오시게”하며 기뻐했다.
육유의 이 말 한 마디는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아울러 육유는 시 한 수를 지어 신기질에게 보냈다. 그 시속에는 큰 인물을 보잘 것 없는 곳에 쓴다는 뜻의 ‘대재소용(大材小用)’이란 글이 적혀 있었다. 신기질은 한탁주를 만나 북벌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한탁주는 그의 명성을 이용했을 뿐, 의견은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한탁주는 황제의 이름으로 불러낸 것을 고려하여 신기질을 진강부의 부지사로 임명했다. 그러나 그는 관직의 높고 낮음에 개의치 않고 북벌에 필요한 인원과 물품을 열심히 조달하였다. 그리고 첩자를 보내어 금나라의 내정을 조사하여 상부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북벌 1년 전에 관직을 삭탈 당하고 고향에서 은거하였다. 결국 한탁주는 북벌에 실패하고 신기질을 재 등용하려 했으나, 그는 이미 중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였다.
이 때부터 대재소용은 ‘큰 인물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작은 일에 쓴다’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와 반대어로는 ‘큰 인물을 크게 쓴다’는 대재대용(大材大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