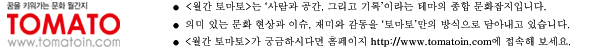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대전에 하나 남은 마지막 달동네의 겨울이 궁금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대동은 달동네보다는 하늘공원과 벽화로 알려졌다. 그래서 가볼 만한 곳, 나들이하러 가기 좋은 곳으로 대동을 찾는다.

눈이 온다고 하던 그날, 다행히 눈은 오지 않았다. 덕분에 대동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다른 여느 동네와 마찬가지로 대동 가는 길에도 가게와 상점이 있다.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만난 건 동네슈퍼다. 대형슈퍼에 비해 깔끔한 외관은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정겨운 모습. 반가운 마음에 그냥 지나치기 아쉬워 살짝 들여다보니 주인아주머니가 열심히 요가를 하고 있다.
혹여 눈이라도 마주칠까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니 옛날 목욕탕이 보인다. 영업한 지 오래됐는지 청온탕이라는 글자를 붙인 유리창 한쪽이 깨졌다. 그 외에도 몇몇 가게가 눈에 띈다. 연탄을 후원하는 연탄은행과 춘하추동 영양탕 집이다.

재래방식으로 기름을 내리고 있는 대동기름집도 있다. 지금은 흔히 볼 수 없는 가게여서 그런지 가게 들여다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한밭여중 가는 길을 지나쳐 조금 더 올라가니 갈림길이 나온다. 직진하면 대동로, 왼쪽은 그냥 길이다.
주택가로 보이는 왼쪽 길로 가기로 맘먹고 발걸음을 옮긴다. 날씨 탓인지 주위에 사람이 없다. 그러다 마주친 할아버지 두 분. 다가가 “경로당이 어디에요?”라고 묻자 “나 가는데.”라는 짧은 대답이 돌아온다. 그렇게 동행하게 된 송재기 할아버지는 대동에 20년 넘게 살았다.

“여기도 많이 좋아졌어. 옛날에는 학고방이었어. 산이고, 밭이었지. 요새는 추워서 경로당에 만날 가. 여름엔 더워서 잘 안 가고.”
어려서부터 대동에 살았다는 송재기 할아버지 친구는 동네 구석구석을 기억하고 있었다.
“저기 빨간 벽돌 빌라 보이지? 예전엔 저기가 과자공장이었어. 군대건빵이랑 과자 만들었지. 옛날에 남쪽에 샘이 있었어. 거기서 물 받아서 먹고 그랬지.”
대나무밭이 많아서 대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유래가 있다. 그에 대해 묻자 고개를 갸웃한다.
“대나무밭은 없었어. 마당에 조금 심어놓은 거는 있었는데 대나무 큰 거는 글쎄. 어른들이 지어놨으니 모르지.”
동네 어르신들이 한자리에
경로당에 들어서자 몇몇 할아버지가 폐지를 분류하는 모습이 보인다. 경로당에서 할아버지들은 내복차림에 고스톱을 치거나 등을 지지며 낮잠을 즐기고 있다.

“할머니들은 안 계시나 봐요?”라고 물으니 이 층에 있단다.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은 일 층은 남자, 이 층은 여자가 쓴다. 예전 대동 모습에 대해 할아버지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던진다.
“개천만 변했어. 대동사거리까지 개천이었어. 도랑이었지.”
“대동다리 복개 공사해서 그렇지. 저쪽은 미나리꽝이었어. 미나리 심고 그랬어. 저수지 하나가 있었지.”
“대전여고는 예전부터 있었어. 한밭여중 자리는 산이랑 밭이었는데 깔아뭉개서 세웠어.”

40년 살았다는 문광열 할아버지(80)는 “용운동 고개 거기도 다 논이었어. 도랑에서 미꾸라지 잡고 그랬어.”라고 말했다. 하늘공원 자리가 묘지였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늘공원 자리가 옛날에는 공동묘지였어. 싹 밀고 새로 만들었어.”
이 층 할머니들이 모여 있는 모습도 일 층과 다르지 않았다. 한쪽에선 고스톱을 한쪽에선 잠을 청하고 있다. “뭐하러 왔슈?”라는 할머니의 물음에 취재하러 왔다고 답하자 “저쪽 총무한테 가서 물어봐유.”라며 친절히 총무 할머니를 불러준다. 회원명단을 정리하던 노인회 총무 송성자 할머니(70)는 대동에 40년 넘게 살았다.
“23살에 시집와서 여지껏 살았어. 그때는 산1번지였어. 전부 학고방이었어. 방 하나 부엌 하나 판때기 붙여서 살았어. 기구하게 살았지. 애들 먹이기도 바빴으니깐.”
할머니는 대나무밭을 기억하고 있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무궁화 아파트 그쪽이 아마 대나무 밭일껴. 포도밭도 있었고. 배, 콩도 심고 그랬어. 집이 없었지. 소로여서 돌고 돌아 틈틈이 다녔어. 다 산이었지. 동네가 지금은 개발돼서 좋아졌어.”

일당 벌어서 먹고 살던 그 시절에는 집 사이에 울타리가 없었다. 그래서 솥단지를 훔쳐가기도 했단다. 그 말에 옆에서 고스톱 치던 한 할머니는 “우리는 세숫대야를 도둑맞았어.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편하게 살지.”라고 덧붙인다.
꼬불꼬불 골목길, 빈집
경로당을 나와 아까 갔던 길을 다시 걷는다. 저 멀리 하늘공원의 풍차가 보인다. 그걸 보며 길을 따라간다. 이쪽으로 가면 되겠거니 해서 걸었더니 막다른 골목이 나온다. 뒤돌아서 나오다 마주친 할아버지께 길을 묻자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며 거기로 가란다. 할아버지 말대로 가니 정말 길이 나온다.

소로였다는 할머니의 말처럼 길이 꼬불꼬불 이어진다. 골목길에서 나오니 멀찍이 벽화가 보인다. 2007년 문화관광부 산하 공공미술추진위에서 실시한 ‘소외지역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동은 지역미술인 30여 명이 참여해 벽화를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미술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그려진 지 좀 오래돼서일까? 벽에 그려진 울타리 색이 바랬다. 벽화를 보며 골목으로 들어서자 아까와는 달리 깔끔하게 정돈된 골목길이 나온다. 파스텔색조 벽화 때문인지 산뜻하다.
집마다 네모난 나무에 주인 이름을 새긴 문패도 걸려 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만 같은 스산함은 없어지지 않는다. 골목길을 벗어나고자 발걸음이 빨라진다. 골목길에서 나오니 이번엔 큰 벽 가득 그려진 벽화가 보인다. 계곡과 연꽃과 나비가 흰 벽을 채우고 있다.

벽화를 보며 걷다 보니 군데군데 빈집이 보인다. 사람의 온기를 찾아볼 수 없는 집은 버려진 처지를 아는 듯 삭막하게 서 있다. 그래서일까? 색색의 벽화와 파란색, 빨간색 슬레이트 지붕에도 대동은 걷는 내내 왠지 처연한 느낌이 들었다.
언덕마루에 서 있는 풍차, 하늘공원
하늘공원 가는 길, 꼬불꼬불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른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풍차에 발걸음을 재촉한다. 올라갈수록 더 넓게 보이는 풍경도 한몫한다.그 맛에 서두르다 보니 어느새 하늘공원 입구다.

입구는 둥근 아치형으로 멋들어지게 장식돼 있다. 계단을 오르자 멀찍이 무덤이 보인다. 순간 공동묘지를 헐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떠오른다. 섬뜩함도 잠시, 해발고도 127m. 달동네 언덕의 가장 높은 곳인 하늘공원에 오르자 대전이 한눈에 들어온다.

조막만 해진 건물 사이에 저 멀리 대전역 쌍둥이 빌딩이 보인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탁 트인 전경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시원해진다.
하늘공원은 2009년 12월, ‘대동마을쉼터사업’의 하나로 동네 언덕마루에 조성했다. 주민이 휴식을 취하며 도심의 풍광을 즐길 수 있게 공원에는 벤치와 정자가 있다. 그리고 풍차가 있다. ‘누구누구 왔다감’, 이름과 이름 사이에 하트도 그려 넣었다. 그렇게 낙서로 뒤덮인 커다란 풍차가 오도카니 서 있다.

내려오는 길은 왔던 길과는 다른 길을 택했다. 골목골목 다른 길을 걷는 재미랄까. 길을 걷다 보니 바람개비가 보인다. 일렬종대를 한 여러 개의 바람개비는 불어오는 바람에도 움직이지 않는다. 단 한 개의 바람개비만이 혼자 분주하게 돌아간다.
대동종합사회복지관을 지나쳐 내려오며 스친 풍경이 아까와 같다. 벽화와 골목길, 빈집은 다른 길이었지만 똑같은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