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없는 세상에 재미난 복수를 날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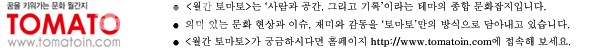
지난 3월 10일, 부산역 앞 광장은 후쿠시마 핵 참사 1주기를 맞이해 탈핵을 외치는 이들이 모여 ‘NUCLEAR FREE WORLD FESTIVAL’을 열었다.

행진 후에는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공연이 늦은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그날의 페스티벌은 새로운 형식의 집회였고, 문화제였다. 집회에 나온 예술인들은 ‘핵’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그 속에 ‘문화’를 더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집회를 문화제로, 페스티벌로 만들었다. 이 페스티벌을 기획한 것이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이다.

◇ 그들의 정체

재미난 복수는 상상력의 빈곤, 다양성을 제한하는 기득권에 대해 ‘재미나게 놂’으로서 복수한다는 뜻으로 2003년 부산대학교 정문 앞 거리에서 부산의 독립예술가들이 시작한 거리축제 ‘재미난 복수’에서 출발한다. 재미난복수는 한 달에 한 번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공연과 전시, 프리마켓을 열어 거리를 지나가는 모든 이가 함께 놀며 소통하는 장을 만들었다.
거리축제 ‘재미난복수’를 통해 부산대학교 앞을 문화의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기존 기득권과 주류에 대한 저항 의식이 강했다. 열린 공간이었던 ‘거리’는 축제에 모인 그들에게 사회에 대한 저항 의식과 행동에 힘을 실어주었다.
‘NUCLEAR FREE WORLD FESTIVAL’의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만난 재미난복수의 김건우 사무국장은 지금의 재미난복수에는 ‘사회운동’과 ‘문화’가 결합한 색깔이 많이 묻어 있다고 말한다.
“70~80년대 당시 부산대학교 정문 앞은 사회변화를 외치는 대학생들의 집회 거리이자, 대학에서 사회로 나가는 상징적인 공간이었어요. 정문 앞에서 집회가 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고요. 집회에 문화제가 곁들여지고 어떨 때는 문화제만 열리기도 했고요. 그때부터 사회운동과 문화는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봤어요”

◇그들의 ‘가치’
재미난복수의 멤버는 랩퍼, 뮤지션, 조각가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는 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10년간 이어온 활동으로 유명해진(?) 재미난복수는 부산에서 열리는 웬만한 공연은 다 기획하고 있다.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이자 김건우 사무국장은 돈 벌려고 하는 일이라며 하기 귀찮다는 대답을 한다.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오늘 한 <NUCLEAR FREE WORLD FESTIVAL>은 돈 한 푼 받지 않고 행사의 모든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하고 준비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가치’이죠.”
그는 서브컬쳐, 인디컬쳐에 기반을 둔 자신들의 활동이 소외당하는 모든 것들과 손을 맞잡음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비주류, 주 문화적이지 않은 것에 더 힘을 실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며 말이다.

지난번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를 준비하면서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연봉이 얼마쯤 되겠노?’ ‘한 오백만원 쯤 되겠네’라고요. 연봉 5백만 원인 비주류 문화 노동자가 모여서 한진중공업 해고자 복직 투쟁에 연대에 참여하려고 며칠 밤잠 설치면서 공연준비를 하는 건 우리가 희망하는 삶이 자본의 교환 가치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진다고 봐요.”
김건우 사무국장은 재미난복수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의 변화라고 말했다. 사회 주류에 속하기 위해 아등바등 경쟁에서 이기려고 사는 삶이 아닌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의 변화다.

서브컬쳐에 기반을 둔 재미난복수는 2008년 Sub-culture 창작시설 독립문화공간 AZIT를 만들었다. 재미난복수가 부산대학교 앞에 비일상적인 표출의 공간 ‘거리’라는 거점을 만들었다면 조금 더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창작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했다.
“부산대학교 안에 수배자들이 생활하던 잠방이 있었어요. 그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예술가를 만났어요. 6평정도 되는 공간이었는데, 이 정도 공간만 있어도 사람들이 모이고 에너지가 모이는구나 싶었죠.”
부산 금정구 장전동의 높은 언덕을 올라 높은 아파트를 지나니 골목 뒤로 불 켜진 아지트가 보였다. 아지트는 원래 어린이집이었다. 재개발로 살던 사람들이 다 떠나자 어린이집도 더는 그 역할을 하지 못했고 2년 동안 텅 빈 상태였다. 이곳에 재미나복수가 들어온 것이다.
행사 준비로 어지럽혀진 아지트를 김건우 씨가 속성으로 안내해준다.
“여기는 전시 공간, 여기는 밴드 연습실, 여기는 녹음실... 전시 공간에는 브라질에서 온 작가의 작품이 그려져 있었다. 재미난복수가 10년 간 이어온 활동을 통해 네트워크가 넓어 여러 나라 작가들 전시가 가능하다고 그가 말했다.
“재미난복수 축제를 시작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해보자. 그래야 사람들에게 축제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해방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 한 번 행사에 대 여섯 팀을 알게 되고, 축제 컨설팅 제안도 들어오더라고요. 일 년에 행사를 서른 번, 마흔 번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강화됐어요. 당연히 아는 영역이 넓죠.”
아지트에서 재미난복수는 많은 젊은 예술가들과 만나며 독립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 공간이 독립문화 공간인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독립문화인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만들고 있는 것인가? 등에 대한 답을 찾으며 대안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누군가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편한 세상이다. 내 허리에 줄을 묶어 끌고만 가준다면 그곳이 어디든 고맙다하고 따라가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낙오되고 소외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하지만, 재미난복수는 이런 사회 시스템은 기득권이 쳐 놓은 트릭일 뿐 더는 속지 말고 자기 주도적으로 변화를 꿈꾸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재미난복수는 내 허리에 묶인 밧줄을 자를 것인지 더욱 동여맬 것인지 고민하게 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